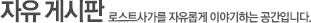- HOME >
- 커뮤니티 >
- 자유 게시판 >
- 전체
자유 게시판 - 전체
| 자유 離騷(이소) 에 대하여 | |||||
| 작성자 | 소위2영자장애 | 작성일 | 2013-12-28 19:20 | 조회수 | 9 |
|---|---|---|---|---|---|
| 「이소」는 굴원이 추방당한 후 유랑 중에 쓴 대표적인 작품으로, 천고에 빛나는 낭만주의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373행 2,490자로, 그의 이상과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이소(離騷)」의 뜻은 동한 반고(班固)의 『이소찬서(離騷贊序)』에 "이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고, 소는 근심이다.(離, 遭也, 騷, 憂也.)"라고 한 것으로 보아 불행을 만나 지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의 발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먼저 자신의 세계(世系), 경력, 정치적인 포부, 추방 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고양씨의 후예이며, 백용의 아들로서, 인의 해인 그 정월, 경인의 날 이 몸 태어났네. 帝高陽之苗裔兮, 朕皇考曰伯庸, 攝提貞于孟陬兮, 惟庚寅吾以降. 둘째, 굴원은 본인의 이상 추구와 실망을 신화를 소재로 한 초현실적 세계를 통해 묘사함으로써, 무도한 세상을 통탄하고 있다. 하(夏)의 계왕(啓王), 걸주(桀紂), 우탕(禹湯), 문왕(文王)에 이르기까지의 폭군과 성왕의 예를 들어 흥망의 원인을 말하는가 하면, 어진 임금을 사모하여 자신의 불우함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날이 새면 저 맑은 백수를 건너, 낭풍산에 올라 말 매고 쉬랬더니, 가다가 돌아보며 흐르는 눈물, 아! 이 산에도 미녀는 없네. 朝吾將濟於白水兮, 登閬風而緤馬. 忽反顧以流涕兮, 哀高丘之無女. 셋째, 天門(천문)은 열리지 않고 친지나 미녀도 만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뜻을 개진할 길이 없게 되자, 복사(卜師)인 영분(靈氛)을 불러 앞날을 물어 보고 있다. 경모풀 대나무로 점 가지 만들고, 영분을 불러 점쳐 보랬더니, 둘이 좋다면야 저절로 합하련만, 뉘 그대를 믿고 좋아하겠는가? 索藑茅以筵篿兮 命靈氛爲余占之, 曰兩美其必合兮, 孰信脩而慕之. 위의 점괘는 초나라에만 미녀가 있는 것이 아니니, 주저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로 가면 분명히 어진 임금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굴원은 영분의 그 점괘로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무함(巫咸)에게 물어 *지 않을 수 없었다. 무함은 영분의 점이 길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서둘러 초나라를 버리고 떠날 것을 간곡히 부탁하지만 굴원은 차마 임금을 버리고 초나라를 멀리 떠날 수 없었다. 다 끝났다! 이 나라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데, 나라를 생각해서 무엇하겠나? 바른 정치 위하여 손잡을 이 없으니, 나는 은나라 때 팽함(굴원이 숭배하는 현인)을 따라 죽으리. 亂曰 : 已矣哉! 國無人莫我知兮, 又何懷乎故都, 旣莫足與爲美政兮, 吾將從彭咸之所居. 이것은 「이소」의 마지막 장으로 굴원의 바램은 어두운 임금을 깨우쳐 나라를 바로 잡는데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정을 알아주는 임금도, 지기도 없었다. 그렇다고 초나라를 버리고 가자니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가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 속 깊이 사모하던 팽함을 따라 죽고자 결심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소」 [離騷]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2010.3.24, 다락원) 이소 [ 離騷 ] 구분: 문학작품 자자: 굴원 춘추 전국 시대 말기인 기원전 3세기경 초(楚)나라에 대시인 굴원이 등장하여 새로운 낭독시를 지었다. 그 대표작이 〈이소〉로서 중국 문학 사상 가장 오래된 장편 서정시이다. 굴원은 초왕을 섬겨 충성을 다했으나 간신의 참소를 받아 추방되고 만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각 지방을 방랑한 뒤 끝내 절망하여 멱라(泊羅)라는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고 전해진다. 그 우국지정을 노래한 것이 이 자서전적인 시이다. ‘이소'란 ‘근심을 느낀다'는 뜻인데 다른 주장도 있다. 이른바 ‘충신연주지정(忠臣戀主之情)'의 효시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그는 우선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출생에서부터 서술하여, 조국과 군왕을 위해 고대 성왕(聖王)처럼 좋은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소인들의 참소에 의하여 왕에게 버림받은 한이 끊일 줄 모르게 노래된다. 한 맺힌 그는 창오산(蒼梧山)에 있는 고대 성군인 순(舜)에게 가 자기의 번민을 호소한 뒤, 자기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 천상 세계를 방황한다. 천제(天帝)의 왕궁 앞에 이르렀으나 문지기는 그를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 그는 실망하여 여신들을 찾아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유사(流沙), 적수(赤水), 부주산(不周山)에서 서해로 방랑한 뒤,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어쩌리오 나라에 사람 없어 나를 아는 이 없으매 / 또 어찌 고향을 생각하리오. / 이미 함께 좋은 정치하기에 족한 이 없으매 / 내 장차 팽함(彭咸)이 있는 곳에 가려 하노라." 팽함은 폭군을 향해 간했으나,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에 투신하여 죽은 옛날의 현인이었다. 굴원은 이미 자기로서도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멱라수에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소 [離騷] (세계문학사 작은사전, 2002.4.1, 가람기획) 편지. 이어척소(鯉魚尺素)의 준말. 어서(魚書). 옛날 먼 곳에서 친구가 잉어 두 마리를 보내 주었는데 그 뱃속에서 서신이 나왔다 함.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童烹鯉魚 中有尺素書(객종원방래 유아쌍리어 호동팽리어 중유척소서 ; 나그네 멀리서 와 내게 잉어 두 마리 주네. 아이 불러 잉어 삶으라 했더니, 뱃속에 편지가 들었다 하네.)<중국 고시古詩 음마장성굴행飮馬長城窟行> 天上多鴻鴈 池中足鯉魚(천상다홍안 지중족리어 ; 하늘에는 기러기 많고, 못에는 잉어 풍족하도다. -편지를 전할 수단이 많다는 뜻임.)<두보杜甫 기고35첨사寄高三十五詹事> *이소안백(鯉素雁帛) : 잉어 뱃속의 편지와 기러기 다리에 붙여 온 서신. 한(漢) 나라 소무(蘇武)가 흉노(匈奴)에 잡혀 있으면서 기러기 다리에 편지를 매어 고국에 전하게 했음. 인홍(鱗鴻). 欲修尺書寄美人 塞鴈不征河鯉沉(욕수척서기미인 새안부정하리침 ; 편지 한 장 써서 고운 이에게 부치려 하나, 변방 기러기 오지를 않고 강물의 잉어도 물 속에 잠기었네.)<이첨李詹 유소사有所思> 去去須珍重 魚書會早傳(거거수진중 어서회조전 ; 가서는 모름지기 몸조심하고, 부디 편지나 빨리 보내 주오.)<권건權健 송대허관찰충청送大虛觀察忠淸> [네이버 지식백과] 이소 [鯉素] (한시어사전, 2007.7.9, 국학자료원) 이소 [ 離騷 ] 요약중국의 서정적 장편 서사시. 저자 굴원 장르 장편 서사시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작품. 이소란 조우(遭憂), 즉 근심을 만난다는 뜻이며 초나라의 회왕(懷王)과 충돌하여 물러나야 했던 실망과 우국(憂國)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자서전식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가계(家系)의 고귀함과 재능의 우수함을 말하고, 이어 역사상의 인물 ·신화 ·전설 ·초목 ·조수 등을 비유로 들어 자신의 결백함을 노래하며, “세속은 틀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 후반은 천계편력(天界遍歷)으로 도가적(道家的) 색채가 짙은 미사여구가 이어지며 낭만적이다. 이러한 정열적인 자기주장과 낭만성은 북방문학인 《시경(詩經)》에는 없고, 남방문학인 《초사(楚辭)》의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전국시대의 설득문학의 대표작이며, 한대(漢代) 이후의 시부(詩賦)에 영향을 끼쳤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소 [離騷] (두산백과) |
|||||
0
0
댓글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로스트사가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입니다.
-
-
제명 로스트사가 상호 (주)위메이드 이용등급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번호 제OL-090327-009호 등급분류 일자 2009-03-27 제작배급업신고번호 제24108-20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