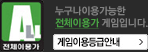- HOME >
- 커뮤니티 >
- 자유 게시판 >
- 전체
자유 게시판 - 전체
| 자유 「공중분해」-『6』 | |||||
| 작성자 | 중위2└Angel♥┐ | 작성일 | 2010-04-08 16:20 | 조회수 | 88 |
|---|---|---|---|---|---|
| 사람들도 , 조직원도 , 심지어 두목마저도 그가 예전에 길가를 걸어다니던 거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단 한명 , 그의 앞에서 " 거지가 출세했네 "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변사체로 발견된 용감한 , 아니 겁이라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아이를 제외하곤 말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 아이는 2년 전에 "그"에게 겁없이 막대사탕을 내밀던 그 부잣집 아이었다. 그 아이도 "평등" 이라는 세상의 이치에 걸맞게 , 부자에서 거지로 강등해버린 소공자가 되버렸다. 그 아이는 자신이 아직도 "부자" 라고 알고 , 그가 "거지" 라고 알고 있다. 아무튼 그 아이가 변사체로 발견된건 , 그의 주변에서 그를 경호하고 있던 조직원들에게 소리없는 공포감과, 위험 , 경고등을 한번에 머리속에 간직하게 한 사건이었다. 이제 그는 예전의 허약하고 나약했던 거지가 아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말투 , 성격 , 얼굴등도 그를 알아볼수 없게 , 어떠한 보호막이 되어 그의 존재를 보호해주었다. " 띠리링 - " 잡초다. 잡초처럼 성가신 존재가 내 발 아래서 살아나려고 꿈틀대고 있다. 이놈들은 뽑아도 뽑아도 죽질 않는다. 내 발 아래에서 꿈틀거리다가 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길 바라는 귀찮은 놈들이다. 아무튼 잡초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난 오른쪽 검지를 입 앞에 대고 , 슬라이드를 연뒤 , 떨리는 손으로 통화버튼을 눌렀다. 난 잡초를 무서워서 떠는게 아니다. 그저 휴대폰 진동때문에 손이 경미한 진동으로 떨린것 뿐이다. 물론 그 속엔 "감격스러워서" 떨리는 진동도 경미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전화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 손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 손의 신경 몇개만 흔들릴만큼 경미하게 떨렸다. " 잡초가 죽었댄다. " 난 듣긴 들었는데 너무 작아서 무엇이라고 한지 정확하게 들을수 없을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최측근 2명이 나에게 의문의 표정을 던지며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식들 . 부담스럽잖아. " 늙은 사자가 사살당했다. " 난 최측근 2명 말고도 ,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했다. "늙은 사자" 는 조직원들이 예전 두목을 즐겨 부르던 애칭이다. 잡초라고 한거니까 못알아들은건가. 이제 "칠성파"의 두목 자리를 손에 넣었다. 정말로 세상이 나의 발 아래에 있다. 2년 전의 사건이 내 머릿속을 불현듯 지나갔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기억 , 어린아이를 죽이려던 기억 , 그러다가 진짜로 죽여버린 기억 , "잡초" 에게서 스카웃 제의를 받은 기억, 붉은벌판. 그때의 초록벌판은 초록벌판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나보다. 붉은벌판은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세상을 돌이키다보니 "세상은 평등하다" 는 생각이 다시한번 내 머리속에 각인되었다. ... 1년 남았다. 내가 천대받던 3년 . 그리고 지금 이 위치까지 오는데 2년. 세상이 평등하다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부귀영화는. 그러면 난 1년동안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 다시한번 기억을 차금차금 더듬었다. " Revenge " 짧은 영어실력으로 한 단어를 내 입밖으로 내뱉었다. " 3년을 1년만에... 서둘러야겠는걸 . "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까. 죽일까 ? 반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을까? 죽이는게 낫다 - 사는것보다 죽는게 나을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나처럼 죽고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것 보다는 자비를 조금 베풀어서 죽여주는것도 나쁘지 않다. 이번 일은 나 혼자서만 해야한다. 그들이 날 무참히 짓밟은것과 내가 그들을 죽이는것 모두 계획된 일이다. 숙명이자 운명이다. 나의 운명을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 도움을 받을수 있다. 찬스쯤 몇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쁠건 없겠지. 죽여버리겠어. 비밀 창고로 들어가서 , 특수제작된 저격총 한 자루를 꺼내 들고 , 벽면에 총알 한발을 발사한뒤 , 출구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갔다. 한걸음 , 한걸음씩 . 오늘따라 유난히 걷는소리가 났다. 구둣굽이 딱딱한 철바닥에 부딧치는 소리. "끼이익 - " 낡은 철문이 바람에 못이겨서 열리는듯, 입구쪽에 왔을때 굳게 잠겨져있던 철문이 열렸다. 빛은 밖에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 들어오는 사람처럼 ,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오늘따라 빛이 밝았다. 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재빨리 벤츠에 타서 , 아지트를 벗어났다. 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가. 폭죽처럼 현기증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혼자서 차를 타는것도 오랜만이다. 난 윗쪽에 깊숙히 숨겨 두었던 갈색 선글라스를 얼굴에 착용하고 창문을 열고 왼쪽 손을 창문 밖으로 내민다. 이상하게도 밖엔 아무것도 들리지도 , 보이지도 않았다.출근시간인데도 자가용은 물론 , 버스나 택시같은 공공수단도 내 눈에 비추지 않았다. 이젠 너무 익숙해져버렸다. 이런 고급 차에 타고 , 고급 선글라스를 끼고, 부하를 거느린다는것. 1년 뒤엔 어떻게 될까. 정말 세상이 평등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가서야 , 좋아하는 아이랑 사귀는 꿈을 꾸다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꾸중에 일어나서 안타까워 하는 아이처럼 그때 가서야 지금 이것이 환상이고 꿈이었다는 생각이 들것 같다. 어린아이처럼 , 가난했던 |
|||||
0
0
댓글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 다음글 「공중분해」-『6』글자제한수로 인한 나머지
- 이전글 우리학교